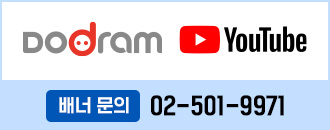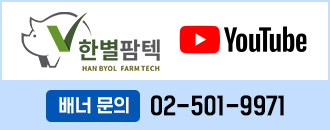1. 축사 냄새관리 강화 추세
축산 관련 냄새 민원이 전체 냄새 민원 중 57.9%로 높은 비율을 차지(13,616/23,511건, 2021년)하고 있으며, 냄새 민원의 주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축산업 활동 중 어떤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축사 냄새(배출 및 처리시설)’로 조사되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설립되고 첫 업무를 시작한 2015년만 해도 축산 관련 냄새 민원은 토지살포 52%, 축사 22%(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년) 순서였으나, 이후 2019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축사 67.6%, 토지살포 15.9%로 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일까?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사 냄새 관리를 강화했다. 2022년 6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돈농가의 축사 냄새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내 적체분뇨 관리를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 14조제2항 및 14조의2제2항, 별표 1)’에 냄새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 적체분뇨 높이를 제한하고 청소하도록 했으며, 냄새저감시설도 상시 가동 및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2. 축사 냄새 발생 원인과 저감방법
축사 냄새는 주로 분뇨, 잉여사료, 돼지털, 먼지 등의 영양물질이 높은 온·습도와 산소가 없는 혐기성 상태에서 혐기성세균에 의해 부패하며 발생한다. 평상시에도 소량의 암모니아 가스(NH3)가 발생한다. 하지만 혐기조건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지방산, 방향족화합물(페놀, 인돌) 등이 복합 발생하여 더 심한 냄새로 불쾌감을 준다.
‘사육단계’에서는 주로 축사를 청소하지 않아 부패한 영양분이나, 가축에서 배출된 분뇨가 슬러리피트에서 장시간 적체·부패하며 발생한다. 또한 ‘분뇨처리 및 이송단계’에서는 교반 등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분뇨의 부패와 분뇨처리시설에 냄새저감시설 미설치 또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사 냄새를 저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축사 내 영양물질을 최소화하고 혐기성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청소 및 신속한 분뇨 배출이 먼저다. 청소는 바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 천장(지붕) 및 환풍기까지 구석구석하고, 바닥은 똥딱지까지 철저하게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이때 미생물제나 부숙이 완료된 액비를 살포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슬러리피트는 분뇨 배출 후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청소하면 좋다. 청소는 돼지 출하 후 돈방이 비었을 때 등 농가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청소가 가능한 곳은 매일매일 진행해야 한다.

축사 청소 및 슬러리피트 내 분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냄새저감시설 효과도 적다. 양돈농가에서 많이 설치하는 안개분무, 바이오 커튼, 탈취탑 등은 주로 암모니아 가스를 저감하는 시설로 축사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휘발성지방산, 황화수소 등에 저감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슬러리피트에 분뇨가 적체되면 농축되고 굳어가면서 혐기성 상태에서 더 큰 냄새와 질식사고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관리가 중요하다.

슬러리피트의 분뇨 배출 주기는 14일 이내를 권장(축산농가 악취관리 매뉴얼, 2018년)하지만, 여름철의 경우는 기온이 높고 미생물 활성도가 높아지므로 가능한 배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좋다. 유럽의 경우는 로봇스크레이퍼를 통해 슬러리피트 내 분뇨를 상시 배출하여 냄새를 저감하는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사례도 있다(선진국 가축분뇨 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24.12.3.~9. 네덜란드·벨기에).

다만 농장과 지역에 가축분뇨 저장 및 처리시설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소 및 신속 배출을 통해 축사 외부로 나온 분뇨 등 냄새 물질을 최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저장 및 처리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예산 지원 등 농장, 지자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 축사 냄새 모니터링과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냄새저감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환경·냄새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냄새저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장에 온·습도 및 암모니아 가스를 측정하는 센서와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측정된 값은 축산환경관리원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냄새 정보는 해당 설치 농가와 지자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냄새 모니터링을 통해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높게 측정될 경우 농가와 지자체에 안내 문자 발송, 현장 확인 및 냄새 저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ICT 기술 적용 사례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AIoT’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애월읍 광령리 양돈단지 2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냄새 발생·확산 예측, 사물인터넷(IoT) 연계로 저감시설 자동 가동, 냄새 발생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 실시간 농가·행정 알림 등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ICT, AI 기술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규제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ICT 기술 활용 모니터링은 환경·냄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초 ICT 기계장비 설치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ICT 기계장비 설치 후 환경부서에서 점검이 나오면 ICT 측정값을 보고 점검을 유연하게 한다며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유지관리(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싶다며 지원이 지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4. 마음가짐
현장을 방문하면 양돈농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우리 농장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라는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는 냄새가 난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도 축체 냄새 등 기본적인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데, 냄새저감 컨설팅으로 방문한 농가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 리가 없다. 오히려 냄새 민원이 없는 농가에서 “냄새가 조금 나죠?”라며 관리를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도 냄새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냄새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노력할 게 없기 때문이다. 다소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말하면 냄새저감 방법의 기본인 청소부터 시작해 보자.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5년 10월호 89~94p 【원고는 ☞ 1079sky@lemi.or.kr로 문의바랍니다.】